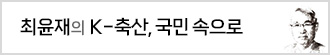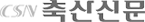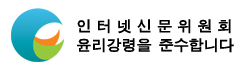[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현장의 가축분뇨 처리에 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양돈장에서 생산된 액비 살포 과정에서 절대 비중을 차지해 온 액비유통센터 운영이 사실상 마비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환경당국과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돈장에서 생산된 액비는 대부분 공동자원화시설 또는 액비유통센터에 의해 위탁 살포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재활용사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액비유통센터의 경우 현행 규정상 거래 양돈장, 즉 분뇨 발생 양돈장에서 사전 확보한 농경지에 한해 액비살포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천시를 비롯해 농경지 상황에 따라 액비살포가 불가능한 시기가 적지 않은데다 유효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시비처방서 재발급을 위해선 8주 가까이 소요, 액비유통센터에서는 다른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환경부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계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 등과 같은 재활용신고 업체가 아닐 경우 분뇨 발생 농장에서 확보한 농경지가 아니면 시스템 자체에 등록이 불가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전과 달리 거래 양돈장의 사전 확보 농경지가 아닌 곳에 살포가 이뤄지면 전자인계시스템에 의해 곧바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되고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따라 액비유통센터들 마다 액비 살포량의 대폭 감축 및 사업 중단을 검토하면서 당장 대안이 없는 양돈장들은 가축분뇨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북의 한 양돈농가는 “액비유통센터로 부터 앞으로 정상적인 액비 살포가 어렵게 됐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당장 액비를 운반하고 살포할 차량 조차 없다. 인근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수급 상황이 여의치 않아 받아줄 상황도 아니다. 막막하다”며 답답해 했다.
국내 양돈장 액비 가운데 절반 정도가 액비유통센터를 통해 살포되고 있는 현실에, 긴 장마 등으로 인해 미처 액비를 살포하지 못했던 양돈장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변경된 전자인계시스템이 본격 가동될 경우 가축분뇨 대란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게 됐다.
전남에서 액비유통센터를 운영해 온 양돈농가는 “오로지 사명감으로 액비유통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비단 우리 뿐 만이 아니다. 살포비 지원이 대폭 줄어든 반면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대부분 액비유통센터들의 공통적인 고민일 것”이라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저장 및 액비화 시설을 갖춘 재활용사업체, 즉 공동자원화시설은 분뇨 발생 농장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농경지에 액비살포가 가능한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
액비유통센터와는 농경지 살포 주체만 다른 만큼 특별히 다른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따라서 액비 살포 관련 규정 전반에 걸쳐 현실적인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관련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자연순환농업협회(회장 이기홍)에서는 액비유통센터들의 저장 및 액비화시설 확보를 통해 재활용신고가 가능토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환경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