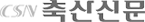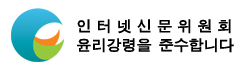김 동 균 상지 대 명예교수(한국가축사양표준제정위원회 위원)
대 명예교수(한국가축사양표준제정위원회 위원)
통계상 면적만 늘어나…부실초지 전락 사례 속출
5-1. 한국전쟁과 소 산업기반의 재생과정
며칠 전, 70년대 중반에 해병 장교로 근무했던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아연실색했다. 2008년 대기업 대리 진급자(현재 40대) 정신교육을 시켰을 때 당시 수강생의 대부분이 6.25라는 단어조차 몰랐다는 점, 그리고 그 전쟁 통에 수백만의 인명이 사라지고 나라가 초토화 된 사실을 거의 몰랐다고 했기 때문이다.
전쟁으로 나라의 기반이 철저히 붕괴되면서 전국의 대가축 역시 군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잡아먹혀 전쟁 직후 한우는 39만두(1950년 통계) 남아있던 것조차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파악이 안 될 정도였고, 그나마 통계 잡기 쉬웠던 젖소는 237두(1951년)만 살아남았지만 자체 증식으로 강산이 한 번 변할 1960년에도 866두에 불과했다.
한우 사육기반은 전쟁 직후 우리 민족의 식생활이 곡식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까닭에 식량 확보가 시급하여 농가마다 논밭을 경작하려고 1~2두씩 보유하는 바람에 1958년에 100만두를 넘어섰다. 이 시기의 한국 농업인구가 총 인구의 8할이었음을 요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까? 한우의 사육두수는 1974년에 178만두까지 급증했으나 다시 감소하다가 1982년에 모든 육우를 한우에 포함시킴으로써 1984년에 처음으로 200만두를 넘기게 되었다. 그럼에도 1981년까지 호당 사육 규모가 1.5두를 밑돌았던 것은, 한국전쟁 이후 한우 증식의 핵심 이유가 경작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경운기가 보급되면서 1980년 이후부터 한우 기반에도 전업농·기업농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편 육류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한우 교잡을 통해 쇠고기 공급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추진했지만 학계에서는 이것이 한우의 멸종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 정부는 한우 보존 정책이 채택되었다. 이 시기에 한우 감정 차 정선지방을 방문했던 필자는 크게 놀랐다. 거의 대부분의 한우가 외래종과 교잡된 이모색(異毛色)이었기 때문이다.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어 오늘날 한우산업이 거세우 및 브랜드화 물결을 타면서 품종을 보존했고 수입육과는 전혀 다른 운명을 개척한 점은 천만다행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젖소의 발전과정은 전혀 다른 길을 밟았다. 즉, 1962년도에 1천여두의 젖소도입으로 시작된 도입정책과 번식기술의 적용에 힘입어 거의 ‘빅뱅’식으로 증식되면서 1977년에 10만두선을 넘더니 9년만에 40만두도 돌파했다. 정부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1974년에는 대단위 목장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한국 낙농업은 놀랄 수준으로 팽창했다. 당시 재벌들이 땅 투기를 위하여 수백만평씩 임야를 사 두었으나 대통령은, 생산성 없이 보유한 땅을 가진 자에게 비명을 지를만한 ‘공한지세(空閑地稅)’를 부과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이에 놀란 재벌기업들은 넓은 땅을 일거에 생산성이 있는 땅으로 바꾸는 길로써 초지를 기반으로 한 ‘소 기르는 사업’을 택했다. 대부분의 토지보유기업은 허겁지겁 대규모 목장을 세웠는데 이 때 조사료 생산, 수확 및 저장시설의 장비 체계에도 신속한 변화를 꾀했다. 당시 농림부 축산국과 축산시험장 그리고 첨단 정보를 다루던 민간기업이 긴밀하게 협조한 끝에 이 사업은 봄에 착수하여 그 해 연말에 자금지원과 집행까지 실시하는 초고속 사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숨은 노력에 힘입어 국내 원유 생산수준은 1990년대 말경에 1960년대보다 약 2천배가 증가되었으며,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량 역시 전쟁 직후 0.046kg에서 1996년도에 50kg대를 넘었으니 1천배 이상 증가한 결과가 되었다. 가히 ‘대폭발’이라 부를만한 실적이다.
이렇게 숨겨졌던 이야기를 펼쳐보니, 우리나라 소 산업이 거의 임종 단계까지 갔다가 되살아 난 코스는 한우와 젖소가 완전히 다른 과정을 밟았음을 알 수 있다.
5-2. 초지개발의 부침과 결실
초지는 조사료를 생산하는 토지기반임과 동시에 방목을 비롯한 다양한 이용 방법을 배워야 할 대상물이기도 하다.
초지, 간척지 및 산야 개발의 통계를 보면, 1967년까지 우리나라의 초지 면적은 4천440ha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엽에 휘몰아친 대단위 목장 건설 붐은 우리나라 초지 개발역사를 크게 변모시켰다. 당시 실세였던 인물이 충남 서산에 750만평의 목장을 건설한 삼화축산과, 대관령에 ‘동양최대의 목장’이라던 삼양축산이 개발되면서 1974년도 초지 면적은 6만ha에 달했다. 또한 대통령이 축산을 진흥시키겠다는 뜻이 있음을 안 관계 당국자들은 초지 개발이 가능한 땅들을 물색하고 판단하기에 바빴으며, 최종적으로 1981년에 농림부가 집계한 초지 개발 가능 면적은 무려 132만5천ha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조성된 후 관리되었던 면적은 5만1천ha에 불과했다. 그나마 제주도를 비롯하여 강원, 충남 등 대단위 개발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를 합해도 2만ha를 밑돌았다.
이후에도 초지 개발 정책이 오랫동안 추진되었지만 통계상으로는 면적이 늘어났어도 실제로는 부실 초지로 전락된 경우가 많아 초지 면적은 답보상태 내지 감소를 거듭하여 오늘날에는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되는 정상 초지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이후 무역 개방화 물결이 세계를 휩쓸면서 축산물의 수입은 물론 사료 자원의 도입이 가능해지자 초지 개발의 시행착오가 준 상처도 조사료 수입이라는 대안으로 덮였고, 도가 지나치다싶으니 정부는 다시 수입 건초량을 통제했지만 고품질 조사료가 필요한 낙농에는 수입 사료값이 하늘을 찔러도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축우산업계는 지금 정도(正道)로 나아가려 한다. ‘자급 조사료를 활용한 우육 및 우유 생산비의 절감’이 그것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