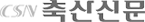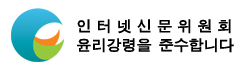[축산신문 기자]
PRRS를 방어하기 위해 전세계에 30개 이상 백신이 개발돼 있다. 하지만 PRRSV는 면역세포에 감염돼 숙주 면역기능을 회피하고 돌연변이가 쉽게 일어나 완벽한 방어 효과를 보이는 백신 개발은 쉽지 않다.
서브유닛백신, 바이러스 벡터백신, DNA백신 등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백신은 약독화 생독백신(MLV, modified live virus)과 불활화 백신(KV, killed vaccine)이다.
대체적으로 불활화 백신의 경우 돈군 내 바이러스 배출이나 변이주 발생과 같은 위험성은 없다. 하지만 약독화 백신에 비해 면역원성이 낮다. 동종 바이러스에 대해 효과를 보이며 이종바이러스에 대한 방어효과가 없어 사용이 제한적이다.
반면에 약독화 백신은 이종바이러스에 대한 교차방어 효과가 높고, 강력한 면역을 형성한다. 하지만 백신주가 병원성을 회복하거나 양성농장의 경우 백신주가 감염주와 재조합하여 병원성이 높은 새로운 변이주 발생의 위험성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약독화 백신주와 야외주 재조합 사례 혹은 약독화 백신주 간 재조합 사례들이 프랑스, 헝가리, 중국, 미국 등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백신 사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PRRS백신은 북미형, 유럽형 약독화 백신과 불활화백신이 있다.
농장에서 어떤 백신을 선택하는지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백신의 성격에 맞춰 어떻게 백신을 활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음성농장에 처음 PRRS가 유입되었다면 돈군을 폐쇄하고 돈사간 돈군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자 장비에 대한 소독에 유의한 후 감염주와 유사한 불활화 백신을 건강한 개체부터 시작하여 전체 돈군에 접종하여 추가확산을 막고 청정화를 시도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외국 사례처럼 농장에서 분리한 바이러스를 이용한 불활화 자가백신을 적용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이겠지만 국내 규정상 아직까지는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북미주나 유럽주가 단독감염되어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농장이라면 감염주와 가장 가까운 생독주를 접종해야 한다. 자돈 접종의 경우 모체이행항체에 의한 백신 간섭현상이 있을 수 있고, 백신마다 충분한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주령에 맞춰 접종을 실시한다.
혼합감염의 경우에도 약독화 생독백신의 이종바이러스에 대한 교차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어 두가지 생독백신을 동시에 사용하기보다 더 우세한 감염주에 맞는 약독화 생독백신을 사용하면 된다. 필요에 따라 다른 타입의 불활화 백신을 추가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약독화 생독백신을 서로 다른 타입으로 교체해야 한다면, 바이러스의 변이와 재조합을 막기 위해 약독화 백신주 배출 가능 기간인, 접종 이후 40-60일 정도를 피해 백신을 교체하는 것이 국내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다양성을 줄이고 농장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백신의 사용과 더불어 돈사 내 남아있는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철저한 소독과 환기, 차단방역을 통한 외부 유입 바이러스의 차단, 정기적 검사를 통해 농장 내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 여부와 사육 구간별 발생 현황, 면역 형성 수준과 같은 상황을 파악하여 PRRS에 대한 대응과 관리가 필요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