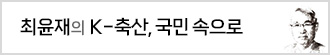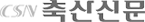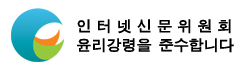[축산신문] 이상호 본지 발행인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유리천장’에 좌절을 느낀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양성평등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도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유리천장’에 좌절을 느낀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양성평등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도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축협 조합장들 사이에서도 이런 유리천장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축협이 각종 사업장을 내려면 인근 단위농협의 동의나 중앙회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얘기다.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게 그들의 항변이다. 단위농협은 축산물유통이나 사료판매까지 손대고 있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를 방관하고 있으며 축협은 속수무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사업 같은 건 축협에는 사실상 금지구역이다. 농축협이 통합될 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며 당시 축협이 강력 반발했던 것도 이런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언젠가 공격축구를 지향하는 한 감독이 수비불안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고 맞받아치는 걸 보고 공감이 가는 반론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뜬금없이 축구이야기를 하는 건 이런 논리가 유리천장에 좌절하고 마땅한 사업을 찾기 어려워 고민 중인 일선축협의 생존전략으로 채택해봄직 하다는 생각에서다.
단위농협은 영세양축가 보호를 축산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축산물을 직접 판매하고 심지어는 업자들을 통해 외지에서 소를 사모아 이를 지역에서 생산된 소라며 유통에 나서는 것도 이런 명분을 깔고 있다. 마땅한 경제사업이 없는 단위조합에는 호재이며 농협중앙회는 소위 업적평가기준이란 걸 통해 이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축협이 사업의 전문성을 내세우며 반발하는 건 허공에 주먹 휘두르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그러나 단위농협에 영세양축가가 있듯이 축협조합원도 열에 아홉은 논농사를 짓고 있다. 이걸 기회로 삼자는 거다. 쩨쩨하게 비료나 농약을 팔자는 게 아니라 쌀을 계약 재배하는 것이다. 여건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양축조합원의 고민거리인 분뇨를 비료로 만들어 쌀 재배농가에 판매하는 대신 여기서 생산된 쌀을 전량 수매하고 벼를 수확한 논에는 액비를 무상 살포해 조사료를 생산, 양축농가에 공급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일석삼조(一石三鳥)가 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적어도 단위농협보다는 축협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물론 어려운 일이고 현실적으로 꿈같은 얘기다. 가축분뇨를 퇴비로 가공하고 쌀을 판매하는 데는 많은 리스크가 따를 것이고 칼자루를 쥔 농협이 수수방관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안 될 이유가 있으면 될 이유도 반드시 있는 게 세상이치다. 퇴비로 생산한 명품 쌀이라면 사업측면에서 매력도 있다. 성공하면 양축농가와 쌀 농가, 그리고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키며 이를 토대로 축협의 미래를 담보할 수도 있다.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듯이 골치 아픈 가축분뇨도 활용하기 따라서는 축복일 수 있다.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은 축협의 현실여건도 모험적이며 창조적인 사고를 가능케 할 추동력이 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창조와 혁신의 결과물은 한 결 같이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고 꿈같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현실화시킨 것이다. 사실이 그렇지만 이 일이 어렵고 힘든 일임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엉뚱한 상상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하기가 망설여지는 이유다. 그래도 그게 분명한 사실인 걸 어쩌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