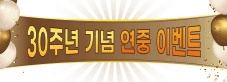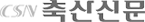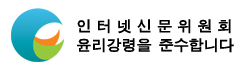농어업기본법서 농산물로 인정 못받아…제도 개선 시급
조사료 유통센터 설치도 제약…자급률 제고정책과 배치
자급조사료 생산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 여론이다. 특히 일선에선 입법 불비로 인해 정책혼선까지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에선 조사료를 수확한 후 말아둔 사일리지를 농지에 야적하거나 보관하면 불법행위가 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 ‘농작물재배업’에서 사료작물 재배업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사료는 농지에서 생산되지만 현행법상 농산물로 인정받지 못한다. 법상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료의 유통시설을 설치할 때도 농지법의 제약을 받는다.
이는 현장에서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조사료 생산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지역에선 최근에 농지에 조사료사일리지를 말아 두었다가 지자체에서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단속 공무원은 조사료사일리지를 논에 야적한 것을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행정지도로 인해 해당농지에 야적됐던 조사료사일리지는 결국 다른 부지를 찾아 옮겨야 했다.
조사료 생산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입장과 배치되는 일들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자급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1천362억원에 이른다. 조사료 자급률 제고는 축산정책의 핵심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미비된 제도 때문에 현장 곳곳에선 정책진행을 막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사료작물 재배 자체가 농작물재배업에서 제외돼 있는 것은 조사료 유통센터 설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농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땅이 농지다. 때문에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의 경우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조사료 유통센터는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사료 유통센터를 매년 확대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이유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법(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정부는 5년 마다 조사료 자급률 목표를 설정, 고시해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법(시행령)에선 자급조사료 생산 확대에 못질을 해놓았다.
정책과 제도 간의 괴리는 결국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