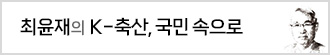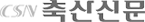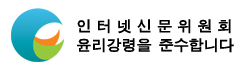서 병  국 조합장(영주축협)
국 조합장(영주축협)
올해는 신축년(辛丑年) 소의 해다.
소의 해를 맞이해 소의 가치와 덕스러움을 생각해 본다.
필자는 어려서부터 소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유소년기에는 소먹이고 꼴 베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다. 봄이면 다래끼 메고 쑥 뿌리를 캐서 쇠죽에 넣어 끓여 먹이고 여름이면 부모님은 논·밭에서 일을 하시고 나는 소를 몰고 산에 가서 뜯어 먹이면 하루의 해가 너무 길었다.
학교에 갔다 오면 오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무리지어 뒷산에 가서 소를 먹이다가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가정 형편이 여의치 못해 선친께서는 농사를 지으시며 장날이면 달구지로 일을 하시어, 지금으로 말하면 농외 소득을 올려서 우리 가족들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니 지게 지고 소 꼴 베는 것은 당연히 장남인 내가 할 일이었다.
옛날에는 우리 집뿐 아니라 다른 집들도 집집마다 농우 소 1마리씩 길러서 농사짓고 1년에 송아지 1마리 생산해 팔면 집안 살림에 큰 보탬이 됐다.
당시 소는 농가의 큰 자산이며 큰 일꾼이었다.
그래서 소 외양간을 초가집 원 채에 붙여 짓고 정성을 다해 쇠죽을 끓여 먹이며 가족처럼 보살펴 왔다. 추운 겨울이면 소등에 짚으로 만든 삼장을 덮어 씌우고, 외양(마구)간 바닥에는 보리 짚을 깔아주고, 다시 문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보리 짚으로 틈새를 막고 쇠죽통 앞에는 멍석으로 만든 커튼을 쳐 소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겨울 동안 푹 쉬고 에너지를 축적한 소는 봄이 되면 논과 밭을 갈고 여름이면 밀·보리·감자 등 농산물을 수확해 실어오고, 가을이면 벼·조·콩·목화 등을 추수해서 실어오고, 겨울이면 먼 산에 가서 땔감 나무를 등에 지고 실어오며, 힘든 일은 말없이 도맡아 해왔다.
그래서 동지섣달 추운 겨울밤도 듬직하게 일해준 한우 덕분에 따뜻한 온돌방에서 긴긴 겨울밤을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농경사회에서 산업화·정보화 사회로 변천하면서 힘든 농사일은 농기계가 대신하고 우리의 한우는 역우에서 육우로 탈바꿈해 고기의 등급으로 가치를 평가받게 됐으며, 국민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귀한 존재가 되었고, 농촌경제의 큰 축으로서 자래매김했다.
한우는 경제적 가치도 소중하지만 그 덕성스러움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춘원 이광수는 ‘우덕송’이라는 제목의 글로서 소를 노래했다. 소는 ‘음매’하고 송아지를 부르는 모양도 좋고, 외양간에 홀로 누워서 밤새도록 슬근슬근 되새김질을 하는 모양은 성인이 천하사(天下事)를 근심하는 듯해 좋고, 어린아이의 손에 고삐를 끌어서 순순히 걸어가는 모양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 같아서 거룩하고, 마지막 죽어서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 인간에게 살과 피와 뼈, 가죽까지 모두 바쳐 보살펴준 주인에게는 경제적 부를 가져다줌으로써 은혜에 보답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만큼 먹고 사는 것 또한 노년기에 접어든 기성세대가 유년시절 소 꼴을 베어서 소를 키우고 소는 그들을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하는 소득원으로, 산업화·정보화 사회를 만들어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진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두고두고 보배 같은 한우의 공덕을 잊지 않고 그 덕스러움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한우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