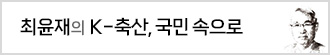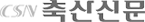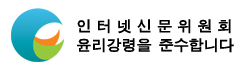[축산신문]
윤 봉 중 본지 회장
 가축은 있으나 축산이 없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좀 뚱딴지같은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축산규모가 미약하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각 축종별 산업을 하나로 아우르고 묶어내는 협동역량의 부재 내지는 부족을 자조(自嘲)하는 말이다.
가축은 있으나 축산이 없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좀 뚱딴지같은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축산규모가 미약하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각 축종별 산업을 하나로 아우르고 묶어내는 협동역량의 부재 내지는 부족을 자조(自嘲)하는 말이다.
우리 축산이 이처럼 ‘처참한 소리’를 듣게 된 건 결국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개별 축종과 관련 산업계가 범 축산차원에서 총력 대처해야 할 현안에도 공동보조는 찾아보기 어렵고 각자도생만 있기 때문이다. 각기 제 팔만 열심히 흔들고 걷는 상황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축산의 민낯이라면 장래는 어둡다. 아니 아예 없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 오래 된 일도 아니다. 몇 년 전 정부의 주선으로 마사회 특별적립금 3억원을 마중물 삼아 축종별 자조금에서 일정액을 거출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자조금연합이 출범했다. 그러나 자조금연합은 출범 초부터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더니 결국 3년도 넘기지 못한 채 좌초하고 말았다. 중국이나 일본은 동업을 하면 회사가 두 배로 커지는데 한국은 동업을 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이른바 ‘동양3국의 동업공식’을 증명한 셈이다.
당시 자조금연합이 성사된 것은 축산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고 축산물에 대한 오해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축산의 근본이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고 말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했음에도 자조금연합이 좌초한 것은 우리 축산업의 총체적 역량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일 수 밖에 없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지 않던가. 풍랑이 거센 바다를 항해하는 배라면 더 더욱 그런 것이다. 모두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노를 저어가야지 이 난리통에 항해의 주도권을 다투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조금연합의 좌초는 그래서 더욱 뼈아프게 느껴진다.
나눔축산운동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나눔운동 실천과 함께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며 축산의 올바른 가치를 알리자는 취지하에 2012년 농협축산경제 주도로 운동본부를 출범했지만 7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농협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있다. 범 축산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이런 류의 운동이나 활동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각 산업분야와 축산현장에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무턱대고 ‘범 축산’만 외칠 일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도구가 쓰여 지게 마련이다. 중장비를 동원해야 할 때가 있고 삽질을 해야 할 때가 따로 있다. 중장비를 동원, 큰 곳을 막고 삽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옳은 순서다. 그런데 앞의 사례처럼 이런 일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셋만 모이면 그럴듯한 건배사를 하며 잔을 치켜드는 문화에 젖어 있다. 축산인들이 모이는 각종 모임에도 예외가 아닌데 이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목격하는 것은 함께보다는 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두 속도를 중시하기 때문일까.
정책을 움직이는 힘은 에둘러 말할 것 없이 표다. 정부와 정치권이 쌀이라면 화들짝 놀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농민정서 즉 표다. 축산이라고 다를까. 총생산규모는 양돈에 비해 작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한우산업을 경제적 비중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책을 견인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은 함께 힘을 모으는 협동에 달려 있다는 말을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