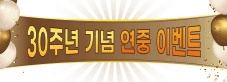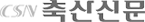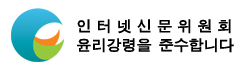낙농산업 안정화를 위해선 배합사료가격 안정이 먼저 돼야 한다.
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최근 ‘한일 낙농업구조 및 파급효과’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 일본은 배합사료 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제곡물가격 변동에 대한 사료비부담을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흡수하면서 실제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구소는 국제시장의 옥수수 가격지수 변동에 따른 한일 양국의 배합사료 가격지수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국제곡물가격이 평균을 상회할 경우 일본에 비해 한국의 배합사료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반대로 국제곡물가격이 평균을 하회할 경우 한국의 배합사료가격이 일본에 비해 낮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연구소는 일본 배합사료 가격이 한국에 비해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덜 받고 있으며, 안정적인 구조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본은 ‘배합사료가격안정대책사업’, ‘사료가격안정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국제곡물가격상승에 따른 사료비부담의 상당부분을 제도적으로 흡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석진 소장은 “한일 양국의 낙농은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낙농의 상대적 중요성, 낙농환경, 낙농기술 및 투입구조 등에 차이가 있다”며 “한일 간 유제품 무역에 있어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 곡물가격상승에 따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의 낙농업 투입구조를 분석한 결과 낙농부문에 대한 농림수산업부문의 투입비율이 일본이 22.6%로 한국의 5.6%에 비해 약 4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낙농부문에 대한 사료투입비율은 한국이 40.4%, 일본이 14.4%로 나타나 국내 낙농산업이 일본에 비해 사료에 대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양국 공통으로 낙농부문의 생산증가가 타 생산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