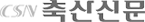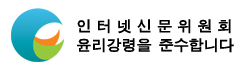[축산신문]
박 규 현 교수(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2025년 1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큰 산불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불은 여러 장소에서 발생하여 같은 달 31일까지 계속되었다. 이 뉴스는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LA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최대 산불인 팰리세이즈 산불이 할리우드 유명인들이 많이 사는 고급 주택가에 큰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국내 언론 매체들도 관심있게 다루었다. 영국 BBC 방송에서는 2025년 1월 13일, 이 산불의 빠른 확산에 대한 원인들을 제시하였다. 그 중 하나는 엘니뇨 등으로 인한 지구의 물 순환고리에 의해 2024년에 폭우가 내리고 습한 날씨에 초목들이 빠르게 자랐고 이후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그 초목들이 건조해지며 땔감 역할을 한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습한 후 건조한 날씨로 되는 현상이 20세기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불어온 강한 바람의 영향을 들었다. 이러한 원인들은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의한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이에 캘리포니아에서는 보통 5~10월에 자주 산불이 발생하였지만 ‘이제는 특정 시즌에만 산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말하였다.
2025년 1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큰 산불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불은 여러 장소에서 발생하여 같은 달 31일까지 계속되었다. 이 뉴스는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LA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최대 산불인 팰리세이즈 산불이 할리우드 유명인들이 많이 사는 고급 주택가에 큰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국내 언론 매체들도 관심있게 다루었다. 영국 BBC 방송에서는 2025년 1월 13일, 이 산불의 빠른 확산에 대한 원인들을 제시하였다. 그 중 하나는 엘니뇨 등으로 인한 지구의 물 순환고리에 의해 2024년에 폭우가 내리고 습한 날씨에 초목들이 빠르게 자랐고 이후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그 초목들이 건조해지며 땔감 역할을 한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습한 후 건조한 날씨로 되는 현상이 20세기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불어온 강한 바람의 영향을 들었다. 이러한 원인들은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의한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이에 캘리포니아에서는 보통 5~10월에 자주 산불이 발생하였지만 ‘이제는 특정 시즌에만 산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말하였다.
2년 이상 강수량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을 장기대기가뭄이라고 부른다. 세계적 논문지인 Science에 2025년 발표된 논문을 보면 1980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대기가뭄에 영향받는 면적은 매년 약 4만9천 제곱킬로미터씩 증가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면적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이니 장기대기가뭄으로 영향받은 곳이 매년 우리나라의 약 반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2025년 1월에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75℃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1.5℃ 이하로 온도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목표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니냐 현상(서태평양 수온 상승으로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지구 평균온도가 약 0.2℃ 하락하는데 그것을 반영하고도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유럽의 남부와 동부, 러시아 서부에서는 1991년~2020년의 평균기온을 넘는 기온이 관측되었으나 아이슬란드, 영국, 아일랜드, 북부 유럽은 평균 이하의 기온을 가졌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지구 열환경의 조건들이 변하면서 기후 패턴이 불안정해지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2024년은 30년간 평균기온보다 2.0℃ 높은 14.5℃를 기록하여 11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였다고 한다. 월 평균기온도 모두 평년보다 높았고 여름철 고온이 9월까지 이어졌으며 열대야 일수는 역대 최대로 많은 24.5일이 기록되어 30년 평균치인 6.6일 대비 3.7배로 증가하였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2024년은 고온, 열대야, 집중호우, 11월 대설 등 다양한 형태의 이상기상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했다.
이러한 전세계적 기상이변은 우리나라의 농작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 뿐 만 아니라 국제 곡물가격에 영향을 준다. 국가농림기상센터의 보고서 ‘식량생산과 기후변화(이병렬, 윤성호)’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국가간 교역이 활발해지고 확대되면서 한 지역의 식량파동이 다른 지역에 파급된다고 한다. 1973~1974년 인도, 중국, 소련 등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발생한 식량부족 현상은 세계 식량파동으로 이어져 곡물가가 평소의 약 4배로 상승하였다고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2012년 9월 11월 발표한 주간이슈분석의 ‘미국의 가뭄으로 인한 세계 곡물가격 상승과 그 영향(김윤옥)’에서는 세계 대두생산의 약 40%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옥수수 수출국인 미국의 중서부 및 내륙 서부에서 발생한 56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옥수수 수출과 대두 수출이 각각 약 20%, 8% 감소하고 대두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식량 수입국이며 2022년 기준 국내 식량자급률은 사료 포함 유무에 따라 각각 49.3%, 22.3%였다. 옥수수, 콩의 자급률을 각각 0.8%, 7.7%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배합사료의 자급률은 2022년 기준은 19.9%였다. 배합사료 원료의 절반이 넘는 곡물류의 자급률은 2.0%에 불과했으나 동물성 단백질, 보조사료, 동물성·광물성 무기물 등의 자급률은 90% 이상이었다. 따라서 곡물가의 변동은 배합사료 가격의 변동으로 이어져 우리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없이 바다 건너 미국의 불을 구경만 하다가는 어느 새 우리 축산농가에 튄 불똥으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