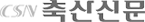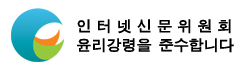[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와 산란계 농가의 오랜 갈등이 결국 ‘2년의 시간 벌기’로 일단락됐다. 산란계의 마리당 사육 사육기준 면적을 확대하는 축산법 개정안의 전체 농가 확대 적용이 2년 더 유예된 것이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와 산란계 농가의 오랜 갈등이 결국 ‘2년의 시간 벌기’로 일단락됐다. 산란계의 마리당 사육 사육기준 면적을 확대하는 축산법 개정안의 전체 농가 확대 적용이 2년 더 유예된 것이다.
이는 동물복지와 축산업 경쟁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정부 정책이 현장의 거센 저항과 부처 간 칸막이에 가로막혀 좌초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행정의 단면이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산란계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을 기존 케이지 기준 수당 0.05㎡에서 0.075㎡로 확대 적용하는 기준이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축산법을 개정하며 7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대한산란계협회를 중심으로 농가들은 법의 소급 적용 문제를 들며 강하게 반발했고 심지어 헌법소원까지 진행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 기준 확대로 인한 계란 생산량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케이지 사육 높이 상향, 축사 신증축 규제 완화 등 다각적인 보완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환경부 등 다른 부처의 규제에 막혀 실행 동력을 잃었고, 결국 정부 스스로 대안 마련에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2년의 추가 유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 2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현재 농식품부와 산란계협회는 단속 유예 결정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산란계가 본격적인 산란에 가담하는 주령 등을 감안할 때, 농가들은 이미 내년부터 새로운 입식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다.
이 중대한 정책 공백이 지속된다면 농가들은 또다시 불확실성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는 결국 미래의 계란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2년 유예를 단순한 시간 끌기나 갈등 회피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물가 안정이나 환경 문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재검토해 지속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단발성 할인 행사나 임시방편의 유예 조치만으로는 계란 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룰 수 없다. 2년 후에는 ‘정책 실패의 유예’가 아닌 ‘성공적 대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결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