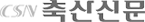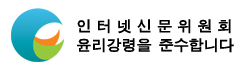| 복경기에 춤을 춰도 시원찮을 토종닭 업계가 엉엉 울고 있다. 토종닭 업계에 있어서 여름은 그야말로 성수기로써 1년 매출의 60~70%를 이 시기에 올려야 하는데, 유사 토종닭의 무분별한 유통과 장마에 따른 소비 부진이 겹쳐 매출 증대에 따른 수익은커녕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란다. 토종닭 kg당 생산비가 1천6백~1천7백원 정도 되는데 요즘 출하되는 가격이 kg당 7백원에 불과하다고 하니 토종닭 업계의 불황이 어느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야말로 대란이다. 때문에 토종닭 사육농가는 멀쩡한 닭을 폐기 처분시키고, 냉동처리하여 보관하는가 하면 불우 이웃에 토종닭을 거저 주는 등으로 1백만마리를 토종닭 업계 스스로 처분했지만, 그런 자구노력도 허사란 것이다. 현장에서 사료값도 건지지 못해 토해 내는 토종닭 사육 농가의 한숨 소리가 우뢰처럼 들리는 듯 하다. 토종닭을 20년 이상 사육했다는 농가들도 이렇게까지 불황을 겪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니 그 한 숨 소리가 오죽 크겠는가. 토종닭이 왜 유독 올해 이렇게 큰 불황을 맞고 있는가. 업계 전문가들은 백세미의 토종닭 둔갑, 유사 토종닭 종계장의 난립, 유색계 수입닭의 토종닭 둔갑, 육계 농가의 토종닭 전업 등에 따른 공급 증가를 그 첫 번째요인으로 꼽고 있다. 특히 백세미의 토종닭 둔갑과 유색계 수입닭의 토종닭 둔갑은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토종닭 산업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진단이고 보면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만하다. 여기다 수요 측면에서 올 여름의 장마가 장기화된데 따른 소비 부진까지 겹쳤으니 토종닭 업계가 겪고 있는 불황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 번 절감케 한다. 결국 이번 토종닭 업계가 겪는 사상 최악의 불황은 토종닭이 산업으로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토종닭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감안할 때 토종닭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토종닭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존재하는 한 토종닭 산업은 어떤 형태로든 안정적으로 토종닭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것이 소비자 시대에 걸 맞는 정책일 것이다. 아울러 토종닭 업계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적인 상황이 있겠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토종닭 산업을 살리는 것은 결국 토종닭 사육농가 자신들임을 다시 한 번 인식, 화합하고 단합해서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는 노력이 배가돼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