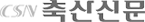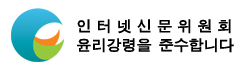| 정부는 내년부터 쌀 생산 조정제를 재도입키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한다. 연간 15만 톤(1백만 섬)의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전국의 농지 97만 ha 가운데 3만 ha(약9천 만평)의 논을 휴경토록 한다는 것이다. 농민이 1ha의 논을 휴경할 경우 3백만원을 받게 된다. 이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9백억원씩 3년 동안 2천700억 원을 확보키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한다. 이사업을 도입키로 한 배경은 쌀 생산, 즉 공급을 줄여 쌀값을 부양하는데 있다. 고육지책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만5천 ha의 논을 대상으로 휴경 직불제를 시행한바 있다. 그러나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보조금을 주는 문제를 놓고 반대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2006년도에 일단 시행을 중단 했지만 소득 직불보전이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이 1조 5천억이나 소요됨에 따라 쌀 생산 조정제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을 감축하는 동시 예산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두자는 뜻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련 중인 쌀 생산 조정제는 축산업계가 볼 때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쌀 감산을 위해 쏟아 붓지 말고 생산 조정제에 해당되는 농지를 축산용지로 할애할 경우 예산도 절약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식품을 확보하는 1석 다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축산업계는 한미 FTA를 비롯 머지않아 외국산 축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를 감축하거나 발가벗고 싸워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시장의 글로벌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기존의 축산여건으로는 국제경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나라 축산업은 누누이 강조 했듯이 그동안 규모화의 진전은 있었지만 외국 축산물과 경쟁하기 위한 체질 개선은 미약했다. 도시가 팽창하고 산업시설이 확장되어 불가피하게 농장을 옮겨야 하지만 갈 곳이 마땅하지 않다. 친환경 조건에 부합되는 요건을 갖출 경우 보다 자유롭게 농지에 진출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축사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경종농업에 없어서는 안 될 퇴비 공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혹자는 축산에 대해 환경을 파괴하는 혐오산업이니, 투기 산업이니 하는 식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산업의 존립기반을 흔들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축산인 들이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거드름을 피우는 꼴이 보기 싫다는 등 정서적으로 배고픔을 참을 수 있지만 배 아픈 것을 못 참는다는 식의 속설적인 측면을 고무시키기도 한다. 축산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감정들이 축산의 입지와 설 땅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데 안타까움이 있다. 1차 산업 가운데 현재에도 가장 경쟁력이 있고 조금만 더 조화 있게 발전시킬 경우 효자 품목이 될 수 있을 것이 확실한데 축사부지할애에 그렇게 인색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일부이기는 하지만 축산분뇨를 이용해 품질이 우수한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관심 또한 많아지고 있다. 퇴비나 액비에서 악취도 크게 개선되고 있음이 목격되고 있다. 아무튼 거듭 강조하지만 축산업과 경종농업이 어우러져 상호보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맞춤 농정을 기대 한다. 쌀을 감산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붓는 정책보다 생산성 높은 농업품목과 농민을 육성하는 안목 있는 농지 정책이 곧 농업의 불루오션이 아닐까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