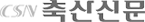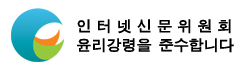| 한미간 FTA, 농지법 개정, 축산식품 관리업무가 축산업계의 당면 3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란 다름 아닌 각각의 현안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 때문이다. 즉 한미간 FTA는 대외적인 개방으로 인한 축산업계의 파장 때문이고, 농지법 개정은 개방 등 어려운 축산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차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며, 축산식품 관리 업무는 최근 정부 일각의 축산식품 관리 체계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대한 우려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우선 한미 FTA 체결은 축산물 시장 개방을 무차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축산업계는 그동안 한미 FTA를 체결하더라도 축산물이 민간 품목에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최근 이와 관련한 소식통에 따르면 축산업계의 희망대로 축산물이 민감품목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90년대 중반 우루과이 협상 당시 축산이 쌀을 보호하기 위한 희생 품목이 되었던 점을 상기하면 이번 한미 FTA를 바라보는 축산인들의 입장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 뒤에도 캐나다, 아세안, 중국, 인도 등과의 FTA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한미 FTA를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문제는 장래 우리 축산의 존폐와 직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축산업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지 않을 수 없는 현안인 것이다. 다음으로 농지법 개정 문제는 본란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지적해 왔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농지에 대한 그동안의 고정 관념에서 탈피, 축사 부지를 농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가 식량을 생산하는 곳이라면, 축산물도 식량인만큼 축산식량을 생산하는 축사의 부지가 농지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더욱이 축사 부지를 농지로 인정, 농지에 축사 진입이 자유로울 경우 친환경 축산은 물론 친환경 농업을 가능케 함으로써 축산과 동시에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농업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만한 대안을 찾아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물론 축사가 농지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마구잡이식 진입을 허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친환경 축산과 친환경 농업이 연계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전제로 한 것임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축산식품 관리 업무다. 축산식품 관리업무는 지난 80년대부터 행정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하는 문제를 놓고 지리한 논란을 벌여오다 지난 98년 현행의 농림부 일관관리시스템으로 사실상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축산식품이 아닌 김치 파동 등을 계기로 축산식품 관리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다. 그런데 이의 논의 방향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관리 시스템이 아닌, 농장따로 식탁따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축산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농장 따로, 식탁따로 식품관리 행정 아래에서는 그 식품의 일관된 안전성 관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농림부의 일관된 축산식품 관리체제가 유지돼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곧 축산업을 지속 가능케 한다는 점이 강조되는 것이다. 결국 축산업계의 이 같은 3대 현안 해결은, 축산물 시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농지법 개정을 통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방안, 그리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축산식품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축산인들이 단합된 힘과 지혜를 모으되, 그것은 단지 구호가 아닌 축산지도자들의 행동으로의 표출이 요구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