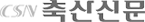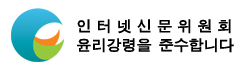[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80~90년대, 양적 성장 넘어 품질·안전성 중심으로
IMF·코로나·가축질병 파고 속에 다져진 산업 경쟁력
반려동물·바이오·수출 확장, 미래 100년 향한 도약
80년대 ‘양적성장 탈피, 질적성장 토대 구축’
축산신문이 탄생한 1985년. 이 80년대 동물약품 산업 성장은 ‘비약’이라는 표현으로는 한참 모자라다. ‘폭발’이 훨씬 더 적정하다.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30%에 달한다.
특히 60~70년대 양적 성장에서 탈피, 80년대에서는 질적 성장을 향해 내달렸다. 신제품 개발, 품질관리 강화, 시설현대화 등이 경쟁력으로 본격 대두됐다.
제도적으로는 1988년 ‘동물약품 품질관리 우수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을 제정, 우수업체에 대해 국가검정을 면제해주는 등 고품질 동물약품 생산을 이끌어갔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1971년 창립 후 동물약품 업계를 대변해 왔다. 하지만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1985년 해산을 결의했다. 당시 기존 협회를 해산해야만 조합 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1992년 4월 재창립됐다.
90년대 ‘안전성 우선…항생제 사용규제 고개’
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1997년 IMF 구제금융. 동물약품 산업 역시 IMF를 기준으로 상황이 뒤바뀌었다.
IMF 전에는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꾸준한 성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후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특히 원료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동물약품 업체에서 피해가 컸다.
90년대 후반 들어서는 동물약품으로 관리해 오던 사료첨가제를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로도 취급할 수 있게 관련법규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동물약품 업계 입장에서는 사료참가제 상당 매출이 사료업계로 이탈됐다.
브루셀라 백신접종, 이에 따른 유산 등 부작용 발생, 그리고 백신접종 중단도 이때다. (97년 12월)
한켠에서는 다국적기업이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 수입완제품 점유율을 높여갔다.
식품안전,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속 항생제 사용규제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농림수산부는 1990년 인체 발암성과 관련,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클로람페니콜, 후라졸리돈 등을 사용제한 조치했다.
아울러 KVGMP 지정 의무화를 예고하는 등 소비자 중심, 품질 중심 동물약품 산업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99년에는 제조·수입업 허가, 품목허가 등 동물약품 관련 업무 일체가 농림부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이관됐다.
2000년대 ‘질병과의 전쟁 핫이슈…업체 책임 강화’
2000년대는 질병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 3월 경기 파주 젖소에서 구제역 발생이 발생,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
농림부는 예방접종키로 하고, 4월 구제역백신을 긴급 공수했다. 이후 유사시를 대비, 98년부터는 구제역백신 항원뱅크(공식 요청 시 6일 이내 한국 도착 조건)를 운영했다.
2003년~2004년에는 고병원성AI가 터지고 말았다. 이후 2006년~2007년, 2008년, 2010~2011년 등 해마다 반복 발생 양상이다.
이들 악성가축질병은 동물약품 업계, 축산업은 물론 국가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타격을 줬다. 예를 들어 2008년 고병원성AI의 경우, 재정적 소요액이 1천817억원에 달했다.
그 사이 가축질병은 축산업계의 가장 큰 핫이슈로 떠올랐다.
대성미생물연구소는 2000년 3월 업계 처음으로 코스닥에 등록됐다. 이후 이글벳, 제일바이오, 씨티씨바이오, 대한뉴팜 등 많은 업체들이 코스닥에 이름을 올렸다.
제도는 규제를 풀어주면서도 업체 책임을 강화하는 양방향으로 흘러갔다.
2000년 11월, 항생물질 제제의 국가검정 제도를 없앴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꾸려져 있는 동물약품 업계. 85년 제정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그 근간이 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01년 9월, 향후 5년 이내에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폐지할 것을 의결, 주무부처에 권고했다.
품질관리 우수업체(KVGMP) 지정 제도도 본격 가동됐다. 특히 2004년 1월부터는 산제, 과립제, 정제 등으로 KVGMP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품목허가 제도도 손질했다.
농림부는 2007년 1월,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 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을 고시,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품목의 경우, 협회에서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협회 부설 동물약품 기술연구소도 이 때 만들어졌다.
2008년 2월부터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축산농가 등이 사용하는 동물약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2010년대 ‘수출 신성장동력으로 부각…처방제 시행에 판도변동’
호황이 영원할 수는 없을 터. 동물약품 성장그래프 기울기는 점점 완만해져갔다. 내수시장에서 더 이상 성장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었다.
업계에는 신성장동력이 필요했다. 선택지는 해외시장 개척. 발품을 팔며, 이리저리 세계시장을 두드렸다.
열매는 달콤했다. 2011년 1억불, 2015년 2억불, 2019년 3억불 달성 등 동물약품 수출은 획기적으로 성장세를 걸었다.
하지만 중소기업 힘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 돈도, 정보도 턱없이 부족했다. 민·관 협력이 가동됐다.
농식품부는 2016년 5월 ‘수출주도형 동물약품 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 업계 수출을 지원사격키로 했다. 현 동물약품 산업 종합지원 사업으로 발전했다.
이를 통해 시설 신축, 개보수, 전략품목 개발, 바이어 발굴, 네트워크 구축 등에 예산이 투입됐다. 이제는 수출없는 동물약품 산업을 상상할 수 없게 됐다. 수출이 곧 성장이라는 공식이 새겨졌다.
국내 시장에서는 구제역을 빼놓을 수 없다. 2010~2011년의 경우 직접 피해액 3조원 등 상처가 컸다.
결국 백신접종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 최대 동물약품 규모인 구제역백신 시장이 이렇게 그려졌다. 구제역백신 국산화 프로젝트도 생겨났다.
소독제는 해외실험을 통해 구제역 소독 효력을 입증해야만 했다.
제도는 식품안전과 건강증진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를 향했다.
2011년 7월부터는 배합사료용 항생제 사용이 금지됐다. 항생제대제체 시장이 꿈틀댔다.
2013년 8월 도입된 수의사 처방제는 구매방식, 소비트렌드, 사용 요령 등에서 동물약품 시장 판도를 확 바꿔놨다.
2020년대 '반려동물 급부상...정부,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
2020년대 초 사회·국가적 키워드는 단연 코로나19다.
코로나19 여파에 주요 동물약품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축산농가, 사료업체 등이 지갑자크를 꽁꽁 걸어채웠다. 수출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다.
동물약품 산업으로 좁히면 반려동물 시장이 부각됐다.
반려동물 산업 성장과 함께 동물약품 업체들은 서둘러 반려동물용 약품을 내놨다. 특히 인체약품 업체들이 이를 활용, 동물약품 시장에 적극 진출했다.
정부 규제심판부는 2023년 3월 인체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농식품부 등에 권고했다.
제도 면에서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모든 동물용 항생·항균제가 처방대상에 들어갔다.
2024년 1월부터는 축산물 PLS(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 등 신종질병이 국내 유입, 관련 제품 개발·공급에 불을 지폈다.
농식품부는 2025년 4월 중장기 동물약품 산업 발전 대책을 내놨다.
여기에는 오는 2035년까지 동물약품 산업 규모를 3배(’23년 1조3천억원→’35년 4조원)로, 수출 규모를 5배(’23년 3천억원→’35년 1조5천억원)로 확대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그 과정에서는 △연구개발(R&D) 강화 △규제 혁신 △수출지원 프로그램 확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동물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동물약품 산업은 주변산업이 아닌 주축산업으로 우뚝 섰다.
현재와 미래 '주축산업으로 우뚝...축산인과 동고동락 진정 동반자'
2024년 말 기준으로 동물약품 제조업체는 의약품 61개소, 의약외품 225개소, 의료기기 427개소 등 총 713개소다.
수입업체는 의약품 111개소, 의약외품 140개소, 의료기기 305개소 등 총 556개소다.
국내 시장 규모는 내수 5천333억5천600만원, 수입완제 4천300억9천500만원 등 총 9천634억5천100만원이다.
2024년 동물약품 수출액은 동물약품 수출액은 원료 1천304억원, 완제 2천802억원 등 총 4천106억원이다.
미화기준으로는 총 3억42만2천달러(부스틴, 사료첨가제 제외)다.
내수 시장과 수출 시장을 합하면, 국내 동물약품 시장 규모는 1조4천억원으로 불어났다.
그렇다고 동물약품 산업 미래에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둡다는 것이 더 가깝다.
내수 시장은 포화고, 수출 시장은 출혈경쟁이다.
하지만 동물약품 업계는 늘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왔다. 앞으로도 결코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축산업과 동고동락해온 동물약품 산업. 축산인 곁에는 즐거움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진정한 동반자 동물약품 산업이 있다.
질병으로부터 가축을 지키고, 생산성을 끌어올렸다고 하면, 그 맨 앞에 동물약품이 꼽힌다.
수해, 폭염 등 재해 피해 시에는 기꺼이 방역물품을 기부한다.
최근에는 식품안전, 건강증진 도우미가 되고 있다.
동물약품 발전은 이제 첨단 바이오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향후 40년은 더 밝을 것이다. 40년 후 동물약품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있을 지 벌써 궁금해진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