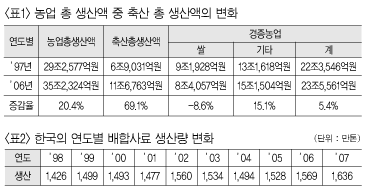사료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사료가격 이야기만 나오면 죄인처럼 어찌할지 모르겠고 화도 난다. 80년 초 필자가 기금관리과장(현 축산발전기금사무국 팀장)으로 재직할 때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사료가격안정대기금’ 설치에 따른 회계제도를 제정한 바 있다. 당시 농림부 송찬원 축산과장(축산국장, 축협회장 역임)께서 일본의 축산진흥공단 제도를 근거로 축산진흥기금을 설치할 때다. 이때 설치된 사료가격안정대기금의 성격과 조성방법은 양축농가와 아무 상관없이 축협중앙회 사료공장을 비롯 배합사료 생산업체가 옥수수, 대두박, 소맥 등을 수입할 때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 이하로 수입하면 차액을 기금에 납입하고, 반대일 때는 기금에서 보조해 수입곡물 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배합사료 가격을 안정시켜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양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불행하게도 그 당시는 축산물 가격의 등락이 심했다. 특히 돼지가격의 변동이 심해 ‘corn-hog cycle’이란 말도 있었다. 축산물 생산비 중 배합사료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낮고 기금이 계속 늘어나 금액이 커지니까 축산농가들이 안정기금이 오히려 사료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불평하자 정부는 시장자율화 역행 등의 이유로 이 제도를 ’84년 폐지했다. 일본은 ’74년 이 제도를 도입해 ’07년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우리가 평균 28%의 사료 가격을 인상할 때 7% 내외에 머물도록 완충역할을 하면서 양축가 보호에 앞장섰다. 지금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축산업 발전과 사료산업 변화 현재 우리의 축산은 과거 1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표1>에서 보듯이 10년간 경종농업은 5% 증가한 반면 축산업은 69%나 성장했다. 1인당 생산량도 농업은 18%에 그쳤지만 축산업은 116%로 대폭 증가했다. ’06년 축산물 생산액도 농업생산액의 33%를 차지해(일본은 31%) 농촌의 대표적인 품목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또한 배합사료 생산량을 비교해 봐도 과거 10여년간 1천500만톤 내외로 공급되었던 것이 최근 2년간 축산물 가격이 회복되면서 ’07년도에는 1천600만톤으로 증가됐다. <표2> 일본은 2천600만톤씩 생산하다가 매년 줄어 2천400만톤 정도 공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득증대와 식문화 개선으로 고급육 생산과 단기비육에 그 원인이 있으며 물론 여기에는 가축 사육두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배합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옛날처럼 꼴망태 메고 풀을 베어 소를 키울 수는 없지만 최대한 배합사료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
■특별기고 / 남경우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